『경험의 멸종』을 읽고

- 한줄평: 양적 측면에 가치를 두는 세상에서 질적 측면의 실종을 기록해내고 있다.
- 추천도: 3.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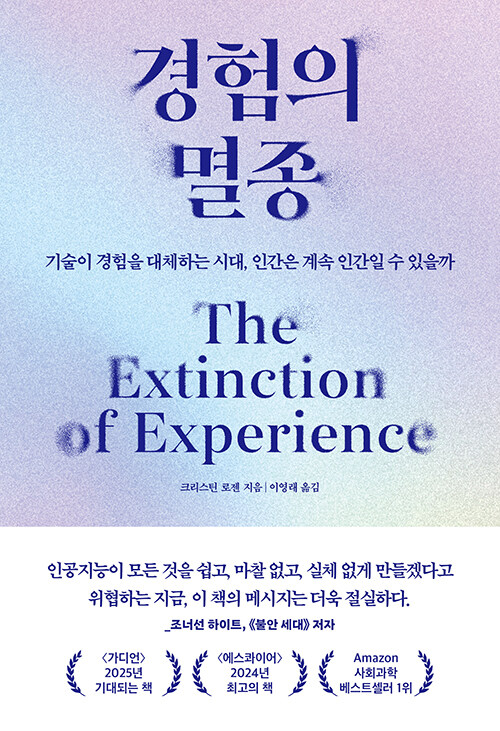
기술은 많은 것들을 풍요롭게 만들었다. 엄청난 기술 혁신을 기반으로 뛰어난 생산성의 향상이 있었고 우리는 갈수록 발전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다. 내가 지금 속한 개발 분야에서도 깊게 체감하고 있다. Stack Overflow의 몰락만 보더라도 이제 개발은 우리보다 AI가 잘하는 시대가 도래했고 우리에게 필요한 역량이 변화해가고 있다. 주어진 문제를 AI가 너무나 잘 풀기에 우리는 문제를 풀기보다 어떤 문제를 풀 것인지, 왜 그 문제를 풀어야 하는지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한다. 문라이트를 개발하는 사람으로서도 ‘세상 많이 좋아졌다.’는 소리가 절로 나온다. 이전에는 접근하기 어려웠던 문제들도 AI와 함께라면 금방 풀어낼 수 있었기에 제품 개선 속도도 크게 향상되었다. 기술의 발전은 많은 것에 큰 이점을 가져다 주었다.
그런데 질문을 좀 바꿔서, 기술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었는가? 분명히 GDP로만 보더라도 크게 증가했고 우리는 풍요 속에서 살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시간이 지날 수록 궁핍함을 느낀다. 행복 지수는 점차 떨어지고 외로움, 스트레스 지수는 증가한다. 이상하다. SNS의 발전으로 우리는 더 쉽게 친구들과 닿을 수 있게 되었는데 오히려 SNS로 인해서 남과 자신의 삶을 비교하게 되고, SNS에는 더욱 자신의 현실을 공유하기보다 보여지고 싶은 순간들을 올리기 십상이다. 우리는 지금 풍요 속에 빈곤을 겪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 서로가 ‘연결 되어’ 있는 이 시대에 사회적 고립 비율은 오히려 높아지고 있다. p.290
이 책은 반기술적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기에 나도 이 책의 모든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다. 하지만 책 속에 반복되어서 나오는 구절은 나를 어느정도 설득시키기에 충분했다.
“기술을 통해 얻은 것은 정량화할 수 있지만 잃어버린 것은 그럴 수 없다.”
우리는 기술이 발전하면 정량적으로 개선됨을 알 수 있다. 특정 작업을 위한 시간이 얼마나 단축되는지, 성능이 이전에 비해 향상되었는지 측정할 수 있다. 다만, 질적으로 잃어버리는 건 알아내기가 어렵다. 질적으로 잃는건 그 순간에 잃는다기보다 점차 누적되면서 돌아보았을 때 잃었음을 깨닫기 때문이다. SNS가 난 그렇다고 본다. 우린 SNS를 통해 더 사람들과 쉽게 연결될 수 있다. 그 여파로 이전보다 친구들을 직접 만나는 시간이 줄었다고 한다. 굳이 시간을 내서 만나지 않아도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SNS를 사용할수록 사회적 고립감과 외로움은 늘어난다. 왜 그러는 것일까?
우린 Software로 창조되지 않았다. Hardware+Software로 창조되었다. 사람은 다른 사람과 직접 대면해서 교류를 하며 살아가야하는 사회적인 생명체다. 하지만 편의성, 생산성 만을 고려한다면 ‘직접’ 만난다는 것은 비효율 그자체이기에 기술 관점에서는 개선되어야할 것으로 치부되었다. 질적으로 잃어버릴 것은 고려하지 못한 채 말이다. 질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사람을 위한 기술은 이 고려를 더 해야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우리는 본능적으로 불확실성을 회피하고 싶어하기에 추천 알고리즘에 쉽게 빠질 수 있다. 여행을 갈 때도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혹은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좋았다고 한 곳들을 최대한 찾아본다.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 개선은 좋지만 AI의 발전으로 추천 알고리즘의 성능이 좋아짐에 따라 이 알고리즘에만 빠져있다보면 우리의 삶은 Deterministic하게 바뀔 것이다. 어떠한 우연한 기회도 만나기 어려운, Optimal한 경로를 찾았지만 오히려 뜻밖의 재미를 얻지 못하는 그런 삶이 되버릴 수 있다. 내 여행도 생각을 해보면 계획하지 않았던 곳에서 이뤄진 어떤 우연한 경험이 많은 추억을 가져왔던 것 같다. 기술을 거부하자는 게 당연히 아니고 경각심을 가지며 어느 정도 자신의 삶을 자신이 컨트롤할 수 있도록, 그 주도권을 외부에 넘겨주지 않도록 깨어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었다.
최신 기술을 배우고 사용하는 나로써 이 책은 다소 불쾌하기도 했지만, (뭐만 하면 기술예찬론자라고 비꼬는 것 같고, 기술에 반대하는 자들을 의인 취급하는게 꼴보긴 싫었다.) 나에게 새로운 관점을 가져다 준 것 같아서 좋았다.

